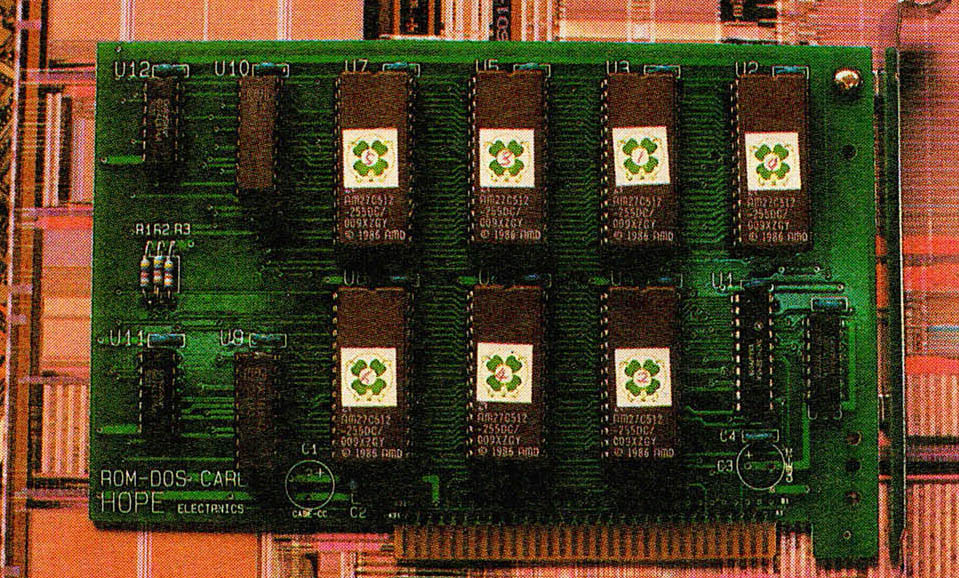▒ 굿바이~! 아리랑위성. 1999년 12월 발사된 우리나라 최초의 다목적실용위성인 아리랑 1호가 지난해 12월 30일 지상관제국과 통신이 두절됐다. 그동안 아리랑 1호는 지상 685km 상공을 남북방향으로 돌며 전세계의 대륙과 해양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영상으로 전했다.
“아리랑위성에 해양관측용 카메라를 장착하긴 했지만 영상의 질이 떨어져 거의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바다는 육지보다 밝기가 어둡기 때문에 굉장히 ‘눈이 좋은’ 렌즈가 필요하거든요.”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위성연구단 안유환 단장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아리랑 1호를 가슴에 묻었다. 대신 4년 전부터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유럽 위성업체 ‘EADS 아스트리움’이 공동으로 개발 중인 통신해양기상위성(COMS)에 해양관측용 카메라를 실어 2009년 발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아리랑 1호가 극궤도위성이었다면 COMS는 지구의 자전속도인 시속 1만1000km로 지구 주위를 도는 정지궤도위성이다. 한반도 상공 3만6000km, 동경 128˚에 머물며 가로, 세로 2500km 영역을 매시간 관측해 해양·기상정보를 생산한다. 탑재될 광학카메라(가시광선 센서)의 해상도가 500×500m 수준이니 관측 영역을 가로, 세로 5000개의 격자로 나눠 정밀하게 살필 수 있는 셈이다.
정지궤도위성은 지금까지 주로 통신 목적으로 사용됐지만 COMS의 경우 한반도 주변 바다를 집중적으로 관측하기에 안성맞춤이다. 6시간 간격으로 바뀌는 밀물과 썰물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중국 양쯔강 연안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이동하는 과정, 남해의 적조가 확산되는 모습까지 감지할 수 있다.

기름띠와 타르볼 움직임도 알아낸다
지난 여름 남해안에서는 사상 최악의 적조가 발생했다. 전남 여수 앞바다의 적조가 남서풍을 타고 경남 남해와 통영으로 확산된 것. 국립수산과학원이 적조예보를 하긴 했지만 배를 타고 연안에 나가 조사하는 수준이라 적조의 이동 속도를 따라잡긴 역부족이었다. 안 단장은 지난 2006년 최첨단 적조분석기술을 개발해 ‘위성원격탐사저널’과 ‘해양환경저널’에 발표했다. 이 기술을 해양관측위성이 찍은 영상에 적용하면 한반도 근해의 적조가 해류를 타고 퍼져 나가는 과정까지 살필 수 있다.
사용하는 빛의 파장에 따라 위성의 쓰임새도 달라진다. 적외선 영역의 빛을 감지하는 센서를 달면 바닷물 표면의 온도를 측정할 수 있고, 마이크로파 센서로는 해수면의 높이, 해류, 풍향, 풍속을 잴 수 있다. 가시광선 센서로는 바닷물의 색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데, 바닷물이 흐려진 원인이 부유물 때문인지, 적조 때문인지는 정확히 구분하지 못했다.
안 단장은 적조를 일으키는 식물플랑크톤이 빛을 흡수하는 정도(흡광도)를 이용하면 부유물과 구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적조를 일으키는 식물플랑크톤의 색소인 클로로필은 440~680nm(나노미터, 1nm=${10}^{-9}$m) 파장의 청색 빛을 가장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진한 초콜릿 빛을 띤다. 반면 광물질과 생물의 사체 같은 부유물은 모든 파장의 빛을 반사하므로 밝게 보인다. 안 단장은 적조와 부유물의 흡광도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 수학적 알고리즘을 적조분석기술에 추가했고 곧 개발될 COMS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지난해 겨울 발생한 태안반도 기름유출 사고처럼 바다 표면의 기름띠도 관측할 수 있을까. 현재 바다 표면을 살피는 데 마이크로파 센서를 장착한 위성이 사용되지만 기름 패치로 덮인 바다에서는 신호를 잘 잡아내지 못한다. 게다가 파도가 높게 치면 마이크로파가 바다 표면에서 난반사를 일으키며 엉뚱한 데이터를 생산하기도 한다. 물속으로 가라앉은 오일볼과 해안가로 떠밀려온 타르볼까지 감지해낼 수 있다면 방제작업을 진행하기도 한결 수월할 텐데 말이다.
안 단장은 “적조와 부유물을 흡광도에 따라 구분하듯 기름의 광학·물리적 성질을 감지해낼 수 있는 새로운 알고리즘을 개발하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해마다 가두리어장을 휩쓸고 지나가는 적조부터 갑작스러운 해양오염사고까지 한반도 주변 바다를 살피며 수호천사 역할을 할 COMS의 활약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