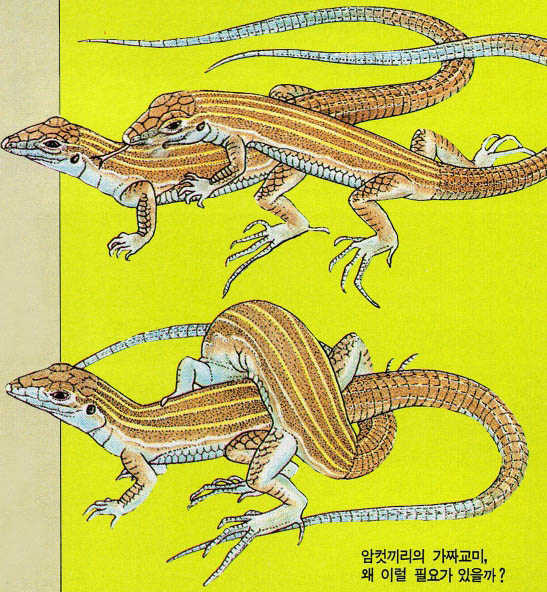60프레임의 착시, 더 부드러워진 아바타
스크린을 사이에 둔 전쟁은 1895년 12월 28일, 프랑스 파리의 한 살롱에서 시작했다. 슬라이드를 이용해 정지된 사진을 보는 것에 익숙했던 파리 시민의 눈에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다. 스크린 속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 이 영상을 만든 주인공은 오귀스트와 루이 뤼미에르 형제였다. 이들이 만든 기계는 ‘시네마토그라프’라는 이름으로 불티나게 팔리며 영화의 시작을 알렸다. 여담으로 뤼미에르 형제는 이 발명 이후 서로 다른 길을 걸었다. 동생인 루이는 계속 사진을 연구하며 프랑스 과학아카데미 회원으로 선출되었다. 형인 오귀스트의 행보는 특별했다. 본래 생화학과 의학에 관심이 있었던 오귀스트는 암 연구로 일생을 보내며, 이에 대한 공로로 프랑스 최고 훈장인 레종도뇌르 훈장을 받았다.
뤼미에르 형제에서 시작된 이 싸움의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프레임’이다. 프레임은 영상을 만들기 위해 그려진(또는 촬영된) 장면 하나를 말한다. 뤼미에르 형제의 시네마토그라프는 1초에 16~18프레임의 사진을 연속적으로 보여줘, 사진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줬다. 16프레임에서 시작된 영화는 18, 20프레임을 거쳐 현재는 24프레임으로 촬영한다. 16에서 무려 1.5배가 증가했다. 프레임 수가 많아지면 스크린 위의 움직임이 더 부드럽게 연결된다. 프레임 수가 움직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눈으로 확인하고 싶다면 일본과 미국 디즈니의 애니메이션을 비교해 보자.
최근에는 24프레임의 두 배인 48프레임 영화도 등장했다(참고로 HD TV의 영상은 30프레임이다). ‘반지의 제왕’으로 알려진 피터 잭슨의 ‘호빗’이다. 감독이 ‘생생하고, 진짜 같은 영상’을 위해 프레임 수를 두 배로 늘리는 바람에, 세계의 많은 영화관이 48프레임 영화 상영을 위한 장비를 갖춰야 했다. 관객들은 끊기지 않고 부드럽게 움직이는 영상에 감탄했고, 심지어는 움직임이 지나치게 역동적이어서 어지럽다는 감상을 보이기도 했다. 최근 ‘아바타2’는 60프레임으로 제작 중이라고 하니, 프레임 수를 늘리는 싸움은 곧 끝날지도 모르겠다.


소리있는 싸움은 계속된다
“잠깐 기다려요! 아직 아무 것도 못 들었잖아요! 기다리라니까요!”
(최초의 장편 유성 영화 ‘재즈 싱어’의 첫 녹음 대사)
1927년, 재즈 가수 알 졸슨은 영화 ‘재즈 싱어’를 통해 현실과 영화 세상 사이에 새로운 싸움이 시작됐음을 알렸다. ‘소리’는 스크린에 등장하는 인물에게 생명을 불어넣는다. 제아무리 훌륭한 배우라도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현실감이 죽는다.
재즈 싱어가 유성 영화가 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당시 신생 영화 제작사인 워너브라더스 사에서 개발한 ‘바이타폰 시스템’이 있다. 이 시스템은 워너브라더스와 스피커의 일종인 진공관 앰프의 특허를 갖고 있는 웨스턴일렉트릭 사의 공동 작품이었다. 녹음기와 카메라를 이용해 소리와 영상을 기록한 뒤, 극장에서는 축음기와 영화 필름을 따로, 그러나 동시에 재생했다.
소리는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했다. 1930년대에 편집이 비교적 쉬운 자기 테이프가 발명됐고, 카메라에는 카메라 소음을 줄이기 위한 방음장치가 달렸다. 마이크는 들려오는 모든 소리를 녹음하는 전방향 마이크(심지어 움직일 때 들리는 옷자락 소리까지 녹음했다!)에서 원하는 방향에서 나는 소리만 골라서 녹음하는 지향성 마이크로 바뀌었다. 최대한 배우에게 가까이 가면서도 카메라에는 보이지 않도록 낚시대에 달렸던 마이크는 이제 붐 대에 매달리게 됐다. 그리고 단순한 녹음을 넘어 어떻게 하면 실제 소리를 그대로 재현할 수 있을지, 아니면 아예 새로운 소리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에 집중하고 있다.
배우의 목소리는 녹음 범위가 10~20°로 매우 좁은 초지향성 마이크를 써서 녹음한다. 정확하게 방향을 재면 거리로는 3~4m까지 녹음이 가능하며, 녹음 각도를 벗어난 잡음은 녹음되지 않는다. 길거리에서 영화나 드라마를 촬영할 때, 주인공의 대화는 잘 들려도 구경꾼의 웅성거림은 잘 녹음되지 않는 이유다.
그렇다면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나, 눈 밟는 소리는 어떻게 포착해야 할까. 영상에서는 눈 밟는 모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구두에 카메라를 바짝 갖다 댔는데, 소리를 잡기 위해 마이크도 함께 대서는 그림이 안 나온다. 대체 어떻게 하는 것일까.
사운드 디자이너라고 불리는 음향효과편집자들의 노하우를 들어보면 영화를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지 궁금해진다. 뺨을 맞는(혹은 때리는) 소리는 박수 소리를 이용한다고 치자. 구두를 신고 걸어가는 모습은 스튜디오에서 여성의 하이힐을 이용해 새로 녹음한다. 하나씩 풀어나가면 점점 기발해진다. 자동차 문을 여닫는 소리는 밥통을 이용하고, 눈 밟는 소리는 녹말가루를 이용한다(직접 해보시라!). 물이 부딪히는 파도 소리는 콩을 흔들어서 낸다. ‘뽀샵질’처럼 컴퓨터 보정은 기본이다. 이런 가짜 소리가 진짜보다 더 ‘리얼’하다. 과연 영화 속에서 들리는 소리는 얼마나 진짜일까. 사운드 디자이너는 스크린을 사이에 두고 관객과 소리있는 싸움을 치루고 있다.

색온도와 빛의 마술
생생한 영상과 소리만으로 영화가 진짜 현실처럼, 또는 현실 이상의 현실로 보이기에는 한계가 있다. 마지막 장치는 ‘색’과 ‘조명’이다. 타는 듯한 붉은 노을에 감탄하며 스마트폰 카메라 안에 그 모습을 담으려는 순간, 액정화면 너머로 보이는 노을은 내 눈에 보이는 노을이 아니다. 하는 수없이 일단 사진을 찍고 사진에 필터를 입혀주는 편집 프로그램을 켜며 한탄한다. 이래서 카메라는 좋은 것을 써야 한다고.
하지만 안타깝게도 카메라 문제가 아니다. 사람 눈과 카메라가 받아들이는 빛 정보가 다르기 때문이다. 즉 사람 눈이 바라보는 색과 카메라가 바라보는 색이 다른 것이다.
카메라는 내장된 측광 센서에서 렌즈를 통해 비춰지는 흰색 물체를 기준으로 붉은색과 파란색 비율을 일정하게 맞춘다. 이 때문에 붉은색 빛을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람 눈과 다른 영상이 찍힐 수밖에 없다. 이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색온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색온도는 영국의 물리학자 켈빈(본명은 윌리엄 톰슨)이 에너지를 100% 흡수하고 다시 100% 배출하는 흑체가 온도에 따라 배출하는 에너지의 색을 구분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이다. 붉은색일수록 색온도가 낮고, 푸른색일수록 높다. 예를 들어 아침이나 저녁의 주황색 태양빛은 4300K, 낮의 노란 태양빛은 5600K, 푸른 하늘의 파란색은 1만K이다.
촬영감독은 이 색온도를 기준으로 시간에 따른 조명과 촬영할 색을 적절히 조절한다. 텅스텐 조명은 3200K, 촛불 2200K 등 이미 여러 광원이나 조명에 대한 색온도가 정해져 있어, 영상을 만드는 사람이 쉽게 색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다. 어둑어둑한 저녁을 만들고 싶으면 조명을 2200K으로 맞추는 식이다. 실제 저녁과는 다른 조명이지만 스크린에는 훨씬 더 실감나는 저녁이 된다. 게다가 조명 색온도에 따라 사람 눈에 색이 다르게 보이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텅스텐 조명은 색온도가 3200K인데, 이 밝기에서 사람은 50K 차이가 나면 다른 색으로 본다. 같은 빨강이어도 어두운 빨강, 밝은 빨강을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맑은 날 햇빛아래, 즉 5500K에서는 200K의 차이까지는 같은 색으로 생각한다.
오히려 색온도를 바꿔서 역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 사람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빛’에 대한 이미지를 영상에 삽입해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대해 암시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아무도 없는 학교 운동장을 생각해보자. 어스름한 저녁노을이 깔려 전체적으로 붉은 빛이 도는 영상에서는 곧 수업이 끝나는 종이 울리고, 집으로 돌아가 가족과 다시 만나려는 학생들의 즐거운 얼굴이 떠오른다. 구름이 잔뜩 껴서 어두운 푸른 빛으로 뒤덮인 학교는 음울한 느낌을 주면서 마치 무슨 사건이 곧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을 준다. 이미 사회적 학습을 통해 색의 상징적인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스크린을 사이에 두고 관객에게 영화 속 세상을 진짜처럼 느끼게 하기 위한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심리학을 이용해 색을 절묘하게 쓰기도 하고, 프레임 수를 늘려 더 부드럽고 실제 같은 움직임을 보이기도 한다. 촬영 현장에서 뛰는 수많은 스태프들과 영화 관객의 싸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관련기사를 계속 보시려면?
INTRO. 상상과 현실, 그 경계에 있는 영화
PART 1. 촬영 현장의 두뇌 싸움
PART 2. 스크린 속 파도는 왜 진짜 파도보다 리얼할까
BRIDGE. 과학 없이는 영화도 없었다 ‘특수효과史’
PRAT 3. 3D 르네상스, 이제 소리도 3D다
“잠깐 기다려요! 아직 아무 것도 못 들었잖아요! 기다리라니까요!”
(최초의 장편 유성 영화 ‘재즈 싱어’의 첫 녹음 대사)
1927년, 재즈 가수 알 졸슨은 영화 ‘재즈 싱어’를 통해 현실과 영화 세상 사이에 새로운 싸움이 시작됐음을 알렸다. ‘소리’는 스크린에 등장하는 인물에게 생명을 불어넣는다. 제아무리 훌륭한 배우라도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현실감이 죽는다.
재즈 싱어가 유성 영화가 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당시 신생 영화 제작사인 워너브라더스 사에서 개발한 ‘바이타폰 시스템’이 있다. 이 시스템은 워너브라더스와 스피커의 일종인 진공관 앰프의 특허를 갖고 있는 웨스턴일렉트릭 사의 공동 작품이었다. 녹음기와 카메라를 이용해 소리와 영상을 기록한 뒤, 극장에서는 축음기와 영화 필름을 따로, 그러나 동시에 재생했다.
소리는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했다. 1930년대에 편집이 비교적 쉬운 자기 테이프가 발명됐고, 카메라에는 카메라 소음을 줄이기 위한 방음장치가 달렸다. 마이크는 들려오는 모든 소리를 녹음하는 전방향 마이크(심지어 움직일 때 들리는 옷자락 소리까지 녹음했다!)에서 원하는 방향에서 나는 소리만 골라서 녹음하는 지향성 마이크로 바뀌었다. 최대한 배우에게 가까이 가면서도 카메라에는 보이지 않도록 낚시대에 달렸던 마이크는 이제 붐 대에 매달리게 됐다. 그리고 단순한 녹음을 넘어 어떻게 하면 실제 소리를 그대로 재현할 수 있을지, 아니면 아예 새로운 소리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에 집중하고 있다.
배우의 목소리는 녹음 범위가 10~20°로 매우 좁은 초지향성 마이크를 써서 녹음한다. 정확하게 방향을 재면 거리로는 3~4m까지 녹음이 가능하며, 녹음 각도를 벗어난 잡음은 녹음되지 않는다. 길거리에서 영화나 드라마를 촬영할 때, 주인공의 대화는 잘 들려도 구경꾼의 웅성거림은 잘 녹음되지 않는 이유다.
그렇다면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나, 눈 밟는 소리는 어떻게 포착해야 할까. 영상에서는 눈 밟는 모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구두에 카메라를 바짝 갖다 댔는데, 소리를 잡기 위해 마이크도 함께 대서는 그림이 안 나온다. 대체 어떻게 하는 것일까.
사운드 디자이너라고 불리는 음향효과편집자들의 노하우를 들어보면 영화를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지 궁금해진다. 뺨을 맞는(혹은 때리는) 소리는 박수 소리를 이용한다고 치자. 구두를 신고 걸어가는 모습은 스튜디오에서 여성의 하이힐을 이용해 새로 녹음한다. 하나씩 풀어나가면 점점 기발해진다. 자동차 문을 여닫는 소리는 밥통을 이용하고, 눈 밟는 소리는 녹말가루를 이용한다(직접 해보시라!). 물이 부딪히는 파도 소리는 콩을 흔들어서 낸다. ‘뽀샵질’처럼 컴퓨터 보정은 기본이다. 이런 가짜 소리가 진짜보다 더 ‘리얼’하다. 과연 영화 속에서 들리는 소리는 얼마나 진짜일까. 사운드 디자이너는 스크린을 사이에 두고 관객과 소리있는 싸움을 치루고 있다.

색온도와 빛의 마술
생생한 영상과 소리만으로 영화가 진짜 현실처럼, 또는 현실 이상의 현실로 보이기에는 한계가 있다. 마지막 장치는 ‘색’과 ‘조명’이다. 타는 듯한 붉은 노을에 감탄하며 스마트폰 카메라 안에 그 모습을 담으려는 순간, 액정화면 너머로 보이는 노을은 내 눈에 보이는 노을이 아니다. 하는 수없이 일단 사진을 찍고 사진에 필터를 입혀주는 편집 프로그램을 켜며 한탄한다. 이래서 카메라는 좋은 것을 써야 한다고.
하지만 안타깝게도 카메라 문제가 아니다. 사람 눈과 카메라가 받아들이는 빛 정보가 다르기 때문이다. 즉 사람 눈이 바라보는 색과 카메라가 바라보는 색이 다른 것이다.
카메라는 내장된 측광 센서에서 렌즈를 통해 비춰지는 흰색 물체를 기준으로 붉은색과 파란색 비율을 일정하게 맞춘다. 이 때문에 붉은색 빛을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람 눈과 다른 영상이 찍힐 수밖에 없다. 이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색온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색온도는 영국의 물리학자 켈빈(본명은 윌리엄 톰슨)이 에너지를 100% 흡수하고 다시 100% 배출하는 흑체가 온도에 따라 배출하는 에너지의 색을 구분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이다. 붉은색일수록 색온도가 낮고, 푸른색일수록 높다. 예를 들어 아침이나 저녁의 주황색 태양빛은 4300K, 낮의 노란 태양빛은 5600K, 푸른 하늘의 파란색은 1만K이다.
촬영감독은 이 색온도를 기준으로 시간에 따른 조명과 촬영할 색을 적절히 조절한다. 텅스텐 조명은 3200K, 촛불 2200K 등 이미 여러 광원이나 조명에 대한 색온도가 정해져 있어, 영상을 만드는 사람이 쉽게 색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다. 어둑어둑한 저녁을 만들고 싶으면 조명을 2200K으로 맞추는 식이다. 실제 저녁과는 다른 조명이지만 스크린에는 훨씬 더 실감나는 저녁이 된다. 게다가 조명 색온도에 따라 사람 눈에 색이 다르게 보이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텅스텐 조명은 색온도가 3200K인데, 이 밝기에서 사람은 50K 차이가 나면 다른 색으로 본다. 같은 빨강이어도 어두운 빨강, 밝은 빨강을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맑은 날 햇빛아래, 즉 5500K에서는 200K의 차이까지는 같은 색으로 생각한다.
오히려 색온도를 바꿔서 역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 사람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빛’에 대한 이미지를 영상에 삽입해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대해 암시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아무도 없는 학교 운동장을 생각해보자. 어스름한 저녁노을이 깔려 전체적으로 붉은 빛이 도는 영상에서는 곧 수업이 끝나는 종이 울리고, 집으로 돌아가 가족과 다시 만나려는 학생들의 즐거운 얼굴이 떠오른다. 구름이 잔뜩 껴서 어두운 푸른 빛으로 뒤덮인 학교는 음울한 느낌을 주면서 마치 무슨 사건이 곧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을 준다. 이미 사회적 학습을 통해 색의 상징적인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스크린을 사이에 두고 관객에게 영화 속 세상을 진짜처럼 느끼게 하기 위한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심리학을 이용해 색을 절묘하게 쓰기도 하고, 프레임 수를 늘려 더 부드럽고 실제 같은 움직임을 보이기도 한다. 촬영 현장에서 뛰는 수많은 스태프들과 영화 관객의 싸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관련기사를 계속 보시려면?
INTRO. 상상과 현실, 그 경계에 있는 영화
PART 1. 촬영 현장의 두뇌 싸움
PART 2. 스크린 속 파도는 왜 진짜 파도보다 리얼할까
BRIDGE. 과학 없이는 영화도 없었다 ‘특수효과史’
PRAT 3. 3D 르네상스, 이제 소리도 3D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