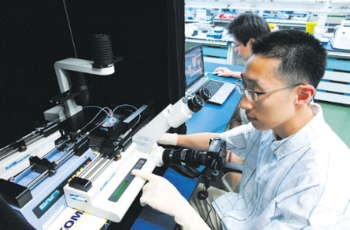2016년 1월 13일 3시. 같은 장소에, 같은 이들이 다시 뭉쳤다.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통계물리학자인 김범준 성균관대 교수부터, 한국인 노벨상 후보로 꼽혔던 김필립 하버드대 교수까지,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왜 현재의 일을 시작하게 됐느냐고 물었다.
“원래 나노튜브를 연구했는데, 이의 연장선상으로 그래핀이라는 평면 물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단 한 장의 평면으로 분리할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이었죠. 몇몇 그룹이 그 연구를 했는데, 당시엔 그 사람들이 있는 줄도 잘 몰랐습니다.”
_김필립 하버드대 물리학과 교수(그래핀)
“원래는 OOO 교수님 실험실에 가려고 면접을 봤는데, 컴퓨터를 할 줄 아냐고 묻더군요. 286이 처음 나왔던 때라 컴퓨터에 익숙한 사람이 많지 않아서 저도 잘 모른다고 대답했는데, 제 옆 친구가 자기는 컴퓨터를 잘한다고 대답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합격하고 저는 떨어졌죠. 억울해서 나도 컴퓨터를 한번 잘해봐
야 겠다는 생각에 컴퓨터 회사에 취직하게 됐습니다.”
_강승우 한국 오라클 상무(소프트웨어 구조)

“양자역학 같은 과목을 배울 때 눈에 보이지 않는 걸 현실과 비교 없이 받아들이는 게 어려웠습니다. 너무 추상적으로 보였어요. (양자역학을 못했던 것이 아니냐고 기자가 묻자) 양자역학은 잘했어요(웃음). 그래서 계산 결과와 현실을 비교해볼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하게 됐죠.”
_김범준 성균관대 물리학과 교수(복잡계 통계물리)
“석사를 마쳤을 때 우연히 기사를 봤어요. 미국에서 우주 개발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어 직장을 잃은 과학자들이 금융계로 진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책 몇 권 보고 무작정 증권회사에 도전했죠. 마침 1996년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선물 시장이 열려서, 증권가에서 이공계생을 뽑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아마 우리학과 출신 중에 선물 거래에 뛰어든 건 제가 처음일 겁니다.”
_이민호 쿼크투자자문 공동대표(선물 거래)
“졸업을 앞두고, 옆에 있는 지승훈 교수와 ‘고급물리 실험’을 들었습니다. 당시에 둘이 실험을 하면서 기계를 많이도 망가뜨렸죠. 그래서 실험은 안 되겠단 생각에 이론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_임명신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천체물리)
“저도 그때 같이 이론을 하기로 마음 먹었어요. 당시에도 입자물리가 인기가 가장 많았는데 그건 너무 어려울 것 같아 고체 물리를 골랐습니다. 계산으로 새로운 재료의 성질을 찾아내는 학문이죠.”
_지승훈 포스텍 물리학과 교수(고체물리)
“대학 때부터 한 달에 한 번씩은 꼬박꼬박 여행을 다녔던 것 같아요. 대학원을 정할 때 평생 공부할 텐데, 이왕이면 좋아하는 일을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택한 게 생태학입니다. 현재는 인공위성으로 몽골과 중국의 사막화를 연구하는데, 시뮬레이션 결과와 실제 현장을 비교해보기 위해 현장조사를 자주 나갑니다. 이제는 유목민들이 저를 반겨줄 정도입니다.”
_강신규 강원대 환경학과 교수(생태학)
촬영은 얼굴이 붉어지기 전에
같은 날 6시. 서울대 내의 식당으로 장소를 옮겼다. 그새 다른 동기들도 자리를 채워 인원이 20명 가까이 늘었다. 촬영을 마무리 하고 뒤늦게 들어온 기자에게 어느 누군가가 다급히 외쳤다. “얼굴 더 빨개지기 전에 얼른 사진 찍읍시다.” 테이블에 와인 잔이 이미 돌고 있었다.
사진작가가 부랴부랴 동창회 사진을 준비할 때, 기자는 뒤늦게 자리를 빛내준 86학번들에게 인터뷰를 시도했다. 그 자리의 유일한 홍일점인 김미영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에게 ‘남자만 가득한 물리학과에서 힘든 점은 없었냐’고 묻자 “없었다”고 대답했다. 남학생들이 즐겨하던 ‘팩차기’ 이야기를 꺼내자 그는 “나도 같이 했다”고 말했다.
단체사진도 그들이 80년대에 촬영했던 빛바랜 사진을 참고해 찍었다. 잔디밭에 누워있던 그때 그 상황을 재현하기 위해 공기정 한국화학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식당 앞 카펫에 몸을 기댔다. 그렇게 30년 만의 사진촬영은 끝이 났고, 30년 만의 동창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불편한 손님인 기자와 사진작가는 얼른 자리를 떴다. 인사를 하고 돌아서는 찰나, 누군가가 또 외쳤다. “우리를 모이게 해줘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