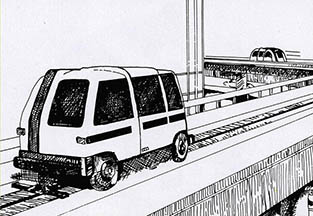우리나라는 2007년 자동차보유 대수 1600만 대를 넘어 2015년이면 2000만 대에 이를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2007년 자동차보유 대수 1600만 대를 넘어 2015년이면 2000만 대에 이를 전망이다.1985년 100만 대를 넘은 지 불과 20년 만의 일이다.
교통사고 발생건수도 크게 늘었다.
이제 운전자와 승객을 보호하는 자동차 안전기술은 자동차의 핵심기술로 자리 잡았다.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연구소에서는 한 해에 수십 번씩 수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부숴가며 안전성 검사를 한다. 자동차 속에는 어떤 안전기술이 숨어 있을까.
최초의 자동차가 개발된 지 약 240년 만에 자동차는 현대인의 발을 대체하는 수단이 됐다. 1769년 프랑스 육군 대위 니콜라 조세프 퀴뇨는 증기엔진을 장착한 3륜 자동차를 최초로 개발했다. 지금과 같은 형태의 디젤 자동차와 가솔린 자동차는 약 100년 전 등장했다.
운전자와 승객을 보호하는 자동차 관련 안전 규정이 만들어진 지는 50년도 채 되지 않는다. 자동차에 안전기술을 도입하면 사고가 일어날 때 다치거나 죽는 비율을 줄일 수 있다는 인식이 없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과거에는 지금처럼 자동차도 많지 않았고 운행속도도 빠르지 않았다.
현재 안전성은 자동차를 구입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필자가 근무하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연구소(이하 자동차성능연구소)에서는 충돌시험, 제동시험, 전자파시험 등 총 42가지의 안전성 검사를 한다.
고속촬영과 인체모형으로 사고 상황 시뮬레이션 한다
‘애애~앵’ 충돌시험을 알리는 경고 사이렌이 울린다. ‘웅웅’하는 엔진소리와 함께 자동차가 시속 56km로 콘크리트 벽을 향해 돌진한다. 곧이어 ‘꽝’하는 굉음이 울려 퍼지며 차체 앞부분이 부서져 파편이 이리저리 튄다. 충돌 직전 태양광 밝기의 약 3배 정도인 할로겐 전등이 번쩍인다. 자동차의 충돌상황을 분석하려면 초당 1000프레임의 고속 카메라로 촬영해야 하는데, 주변이 어두우면 촬영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동차성능연구소에서는 이 같은 차량 충돌시험을 1년에 약 100여 번가량 한다. 국내 소형차부터 고급 외제승용차까지 모두 충돌시험 대상이다. 적게는 1대에 2000~3000만 원에서 많게는 8000만 원 이상의 자동차 수십 대를 망가뜨려가며 충돌시험을 하는 이유는 뭘까. 충돌시험으로 실제로 사고가 났을 때 탑승자가 받을 충격을 시뮬레이션한 뒤 차량의 안전성을 높일 방안을 찾기 위해서다.
충돌시험에는 탑승자 대신 ‘더미’라는 인체모형이 쓰인다. 인체모형에는 자동차가 충돌할 때 머리나 가슴, 척추, 다리 같은 신체 각 부위가 받는 가속도와 충격량 등 여러 가지 물리량을 측정하기 위한 80여 개의 센서가 달려 있다.
미국의 제네럴모터스(GM)사는 1971년 정면충돌용 인체모형 ‘하이브리드I’을 개발했고, 이듬해인 1972년에 하이브리드II, 1976년에 하이브리드III를 개발했다. 현재까지도 제네럴모터스사가 만든 하이브리드III가 충돌시험에 쓰인다. 사람을 대신해 몸을 던지는 인체모형의 가격은 얼마나 될까. 모형 1개당 가격은 2억 원 정도로 ‘귀하신 몸’이다. 게다가 수명도 짧아 약 30번 정도 충돌시험을 하면 더 이상 쓸 수 없다.

충격력 줄이는 크럼플존
자동차가 충돌할 때 어떤 일이 생길까. 고속촬영한 영상을 분석해보면 정면충돌은 눈 깜짝할 사이와 같은 0.1~0.2초 사이에 일어나며 충돌과정은 총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충돌할 때 자동차 앞부분이 찌그러지면서 자동차가 받는 충격력(힘)을 줄이는 과정을 1차 충돌이라고 한다. 이때 찌그러지는 부분을 ‘크럼플존’이라고 부르는데, 크럼플존은 종이상자처럼 쉽게 찌그러질 정도로 강도가 약해도 안 되고 웬만한 충격에 꿈쩍도 안 할 정도로 너무 단단해서도 안 된다. 왜 그럴까.
예를 들어 30m 높이의 야자나무에 달린 코코넛 열매가 땅으로 떨어진다고 하자. 만약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껍질이 부서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열매가 땅에 떨어질 때 받는 충격량은 충돌할 때 받는 힘과 그 힘을 받는 시간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떨어지면서 열매가 받는 충격량은 일정하기 때문에 껍질이 부서지며 힘을 받는 시간이 길어지면 열매가 받는 힘은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야구 글러브로 공을 받는 순간 손을 뒤로 빼면서 받으면 손이 덜 아픈 것과 같은 원리다. 또한 바깥 껍질을 부수는데 대부분의 힘을 소모하기 때문에 내부의 과일이나 씨앗은 안전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크럼플존은 충돌할 때 걸리는 시간을 길게 해 충격력을 줄일 뿐 아니라 충격량이 탑승자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일을 막는다.
자동차가 벽이나 다른 차와 충돌하면 0.1초 이내에 승객은 관성에 의해 튕겨져 나가 핸들이나 앞 유리, 좌석 등 자동차 내부 장치와 부딪치게 되는데 이를 2차 충돌이라 부른다. 운전자나 탑승객은 1차 충돌이 아니라 2차 충돌 때 부상을 많이 입는다. 2차 충돌로 입는 피해를 줄이려면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안전띠를 매지 않을 경우 운전자가 핸들에 가슴을 부딪히며 받는 충격은 자기 체중의 80배가 넘는다. 예를 들어 몸무게가 60kg인 운전자가 받는 힘은 무려 5t이나 되는 셈이다. 갈비뼈는 이정도 충격을 받으면 쉽게 부러진다.
2차 충돌 이후 몸 내부의 장기들끼리 서로 부딪치면서 운전자나 탑승객은 또 다른 부상을 입는데, 이를 3차 충돌이라 한다. 1차 충돌에서 차체가 충격력을 많이 흡수하고 안전띠를 착용해 관성을 줄여야 2차, 3차 충돌에 의한 부상을 줄일 수 있다.

제어불능 자동차 바로잡는 ABS와 ESC
자동차성능연구소에서 검사하는 또 다른 주요항목은 주행시험과 제동시험이다. 시속 100km로 달리는 자동차에서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으면 어떻게 될까. 차가 빙글빙글 돌거나 차의 주행방향이 180° 바뀌며 위험한 상황을 맞을 수 있다.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자동차가 돌거나 뒤집히지 않게 하기 위한 기술이 바퀴잠김방지식제동장치(ABS)와 전자식자세제어장치(ESC)다.
자동차는 지면과 타이어 사이의 마찰력을 이용해 속도를 줄이거나 멈춘다. 그런데 ABS를 장착하지 않은 자동차는 브레이크를 밟으면 바퀴가 돌지 못해 제동거리가 평소보다 길어져 사고날 확률이 커진다. 차가 도로에서 미끄러지면서 도로와 타이어 사이의 마찰력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ABS는 브레이크가 바퀴를 잡았다 놓는 동작을 빠르게 되풀이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은 상황에서도 핸들을 조정할 수 있다. 자동차가 미끄러지는 일을 막을 뿐 아니라 장애물을 피할 수 있어 사고를 크게 줄인다.
ESC는 ABS보다 한 단계 더 발전된 기술로 차의 진행방향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는 장치다. 자동차가 고속으로 달리는 도중 갑자기 다른 차가 끼어들거나 장애물이 나타나면 운전자는 본능적으로 핸들을 반대방향으로 돌린다. 고속으로 달리는 도중 핸들을 조금만 돌려도 차는 주행방향에서 크게 이탈해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다른 차와 충돌할 수 있다. ESC는 자동차의 방향이 갑자기 바뀌는 것을 감지하고 네 바퀴에 각각 다른 제동력을 줘 자동차가 본래 진행 방향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도록 돕는다.
하지만 ABS와 ESC의 도움을 받더라도 기본적으로 자동차는 바퀴와 도로면 사이의 마찰력을 이용해 차를 세우기 때문에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 사람의 반응시간과 마찰력을 고려할 때 시속 100km로 달릴 경우 최소 100m의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는 안전거리를 지키는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보행자 보호하는 차량 안전기술
{BIMG_5}최근에는 차량에 전자파적합성(EMC) 시험도 도입했다. 점차 자동차에 전자부품이 많이 쓰이면서 자동차가 전자파에 민감해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1980년대 이전에 생산된 자동차는 ‘아날로그 자동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자동차의 엔진은 물론 제동장치 등 대부분 장치가 디지털 방식으로 제어된다. 자동차의 전자 부품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노이즈가 다른 부품에 서로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고 외부에서 발생한 전자파노이즈로부터 영향을 받지도 않아야 한다.
운전자뿐 아니라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연구도 활발하다. 자동차성능연구소에서는 범퍼에 다리모형을 부딪히는 실험과 머리모형을 보닛에 부딪히는 실험을 한다. 보행자가 자동차에 부딪힐 때 자동차가 충격력을 흡수할수록 보행자가 덜 다친다. 그래서 자동차성능연구소는 통계치를 근거로 어린이와 어른의 다리 모형과 머리 모형을 만들어 모형들이 자동차에 부딪힐 때 받는 충격을 최소로 줄일 방법을 연구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가 보행자와 부딪히는 것이 감지되면 보닛을 살짝 들어 올렸다가 머리가 부딪힐 때 같이 내려가면서 충격력을 줄일 수 있다. 보행자의 다리가 범퍼에 부딪히면 무릎이나 엉덩이뼈가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범퍼에 충격 흡수재를 사용하고 범퍼 아래에 넣는 새로운 충격흡수 구조물을 연구한다.
미래의 차량에는 더 많은 안전기술이 도입될 것이다. 하지만 안전성만을 고려해 자동차를 만든다면 가격은 끝도 없이 올라간다. 그래서 정부와 자동차 회사들은 가격과 효율성 사이에서 끝없이 고민한다. 자동차에는 소비자의 부담은 최소로 줄이면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과학자와 엔지니어의 노력이 담겨 있는 셈이다.
운전자 생명 구하는 폭탄, ‘에어백’
 에어백은 안전벨트와 함께 가장 널리 쓰이는 차량 안전장치로 센서가 충돌을 감지할 때 작동한다. 에어백은 사람이 눈을 깜박이는 데 걸리는 시간(0.2초) 보다도 더 짧은 시간(0.03초)에 반응한다. 에어백의 센서는 자동차의 충돌을 감지하면 0.03초 안에 에어백을 터트릴지 여부를 판단해 다시 0.03초 안에 에어백을 완전히 부풀린다. 에어백이 부풀어 오르는 빠르기를 속도로 환산하면 시속 200~300km에 이른다.
에어백은 안전벨트와 함께 가장 널리 쓰이는 차량 안전장치로 센서가 충돌을 감지할 때 작동한다. 에어백은 사람이 눈을 깜박이는 데 걸리는 시간(0.2초) 보다도 더 짧은 시간(0.03초)에 반응한다. 에어백의 센서는 자동차의 충돌을 감지하면 0.03초 안에 에어백을 터트릴지 여부를 판단해 다시 0.03초 안에 에어백을 완전히 부풀린다. 에어백이 부풀어 오르는 빠르기를 속도로 환산하면 시속 200~300km에 이른다.에어백은 어떻게 눈 깜짝할 사이에 팽창할까. 에어백은 일종의 ‘폭탄’으로, 폭발로 생긴 가스를 이용한다. 에어백을 부풀리는데 쓰이는 물질은 나트륨과 질소로 이뤄진 화합물인 아지드화나트륨(NaN3)이다. 이 물질은 폭발로 생긴 열을 흡수해 분해되면서 많은 양의 질소기체를 발생시킨다. 에어백이 완전히 부푼 뒤에는 표면에 뚫려 있는 미세한 구멍과 배기구로 질소 기체가 순식간에 빠져나가 탑승자가 에어백에 부딪힐 때 받는 충격을 줄이고 질식사하는 일도 막는다.
에어백은 언제부터 자동차에 쓰였을까. 1967년 미국의 크라이슬러사가 최초로 에어백을 도입했다. 이 무렵 미국이나 독일 등 선진국의 자동차 회사들은 운전자 안전에 큰 관심을 보였다. 당시에는 안전띠를 착용하는 비율이 낮아 사망사고가 많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1994년 현대자동차의 뉴그랜저에 처음으로 에어백이 도입됐다. 최근에는 운전자 전용 에어백뿐 아니라 조수석과 뒷좌석에 설치하는 에어백과 측면 에어백도 개발돼 인명을 구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김종수 연구위원은 미국 오하이오주립대 기계과에서 자동차안전기술로 석사학위를 받은 뒤 미국 자동차회사에 잠시 근무하다 교통안전공단으로 자리를 옮겼다. 국토해양부와 함께 현재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안전기준을 제정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