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겨울에 접어들면 첫눈이 내릴 날을 기다리게 된다. 소매 위에 내린 하얀 눈을 자세히 보면 다채로운 6각형 모양이다. 도대체 어떻게 물이 얼면서 이렇게 정교한 모양을 만들어낼까. 눈 결정의 비밀은 그 구성 물질인 물 분자, 즉 H2O의 구조 때문이다. 광물인 석영도 마찬가지다. 석영 원석을 보면 투명한 6각 기둥이 삐쭉삐쭉 솟아있다. 역시 구성 성분인 이산화규소(SiO2)의 공간배치가 이런 모양의 결정을 이루게 한다.
포스텍에 있는 반도체 나노막대 연구단은 눈이나 석영 결정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응용해 나노구조물을 만든다. 기존의 반도체 회로 기판을 만들 때처럼 사람이 일일이 패턴을 만들고 식각을 할 필요가 없다. 즉 조각처럼 큰 덩어리에서 깎아나가는 방식인 ‘깎아내기’(top-down)가 아니라 레고 블록처럼 원자나 분자가 서로 달라붙어 구조물을 만드는 ‘쌓아가기’(bottom-up) 방식이다. 반도체 나노막대 연구단은 어떤 비법을 개발해 이런 마술 같은 현상을 나노 수준에서 구현할 수 있었을까.

우연한 발견이 연구 방향 바꿔
“지금까지 나노구조물에 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구슬이 많으면 뭐합니까. 꿰어야 보배지요. 저희 연구단은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크기로 나노구조물을 만드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단 단장을 맡고 있는 포스텍 신소재공학과 이규철 교수의 설명이다. 이 교수가 쌓아가기 방식으로 나노구조물을 만드는 연구를 하게 된 계기는 200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반도체 박막을 연구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우연히 표면이 우둘투둘한 박막이 만들어졌던 것. ‘이게 뭐야!’라며 버릴 수도 있었지만 전자현미경으로 확대된 박막 표면을 자세히 살펴보던 이 단장은 수십 nm(나노미터, 1nm=10-9m) 지름의 나노기둥이 빽빽이 솟아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도대체 어떤 원리로 이런 환상적인 구조가 나왔는지 궁금해지더군요. 이때부터 나노막대 연구가 시작됐죠.” 나노연구를 본격화한 이 교수팀은 반도체 물질인 산화아연(ZnO)이 나노기둥을 만드는 원리를 밝혀냈다. 특정한 온도와 기압에서 석영의 6각 기둥처럼 기둥모양으로 결정을 만드는 게 더 안정하기 때문이다.
이 교수팀은 이 연구결과를 2002년 6월 응용물리분야 학술지인 ‘어플라이드 피직스 레터’에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이 논문은 지금까지 400회 이상 인용됐을 정도로 나노막대 분야의 연구방향에 큰 영향을 미쳤다. 2003년에는 나노막대의 양자효과를 관측해 재료과학 학술지인 ‘어드밴스드 머티리얼스’ 표지논문으로 발표했다. 곧이어 나노막대를 이용해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는(정류현상) 나노다이오드를 개발했다.
2004년 초에는 세계 최고 품질의 나노막대를 개발했다. 결국 쌓아가기 방식의 나노구조물 연구가 인정받아 이 교수팀은 2004년 창의연구단에 선정되는 기쁨을 맛봤다.
“저희 나노기둥의 장점은 촉매를 쓰지 않고도 손쉽게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순도가 높은 결정을 얻을 수 있죠.”
이 교수팀이 개발한 방법은 ‘비촉매 유기금속 화학기상 증착법’이라고 부른다. 쉽게 말하면 유기금속(에틸기 2개가 붙은 아연)을 기체화시켜 대략 600℃의 고온에서 산소분자와 반응시켜 금속산화물(산화아연) 결정을 기판 표면에 만드는 방법이다. 이때 기판을 어떻게 조작하느냐에 따라 나노막대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나노튜브가 나오기도 한다.
“여기 빨갛게 달궈진 부분에 기판이 놓여 있습니다. 관을 통해 온 기체가 여기서 산소와 반응해 산화아연 결정으로 자랍니다.” 나노구조물을 만드는 과정을 보여 달라는 요청에 박사과정 이철호 씨가 제조 과정을 설명해준다. 붉은 빛이 나는 부분은 600℃로 유기금속과 산소가 반응하려면 이 정도 온도는 돼야 한다.

장점 많은 산화아연 나노 소재
연구단이 산화아연에 주목하는 이유는 기존의 실리콘 반도체에 비해 장점이 많기 때문이다. 먼저 산화아연은 투명하다. 결정이 한 방향으로 자라는 성질이 있어서 나노막대 형태의 구조를 만들기도 쉬운 편이다. 또 전류를 흘리면 빛을 내는 광학적 특성이 매우 우수하다. 따라서 산화아연 나노구조물은 효과적인 발광소자나 태양전지소자로 쓰일 수 있다. 반면 실리콘은 전류를 흘려도 빛을 내지 못하고 열로 흩어진다.
“최근에는 나노구조물을 만드는 연구에서 배열하는 연구로 트렌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실제 작동하는 나노회로나 장치를 만들려면 부품이 제자리에 놓여 있어야하기 때문이죠.” 설사 나노부품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나노집게로 일일이 제자리에 옮겨놓을 수는 없는 일. 지난 10여 년 동안 나노붐이 거세게 일었지만 최근 주춤한 이유도 이런 패러다임 전환이 벽에 부딪쳤기 때문이다. 연구단은 특정 위치에서만 나노막대와 나노튜브를 성장시키는 방법을 개발해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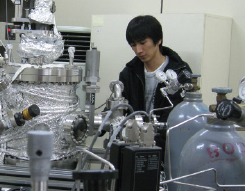 결정 성장 방향 제어가 중요
결정 성장 방향 제어가 중요
“결정이 자라려면 구성원소가 기존 결정이나 물질에 달라붙어야 합니다. 눈 결정이 자라려면 먼지 같은 핵이 필요한 이유죠.” 연구단은 산화아연이 구조가 다른 이산화규소보다는 결정구조가 비슷한 질화갈륨(GaN)에 더 잘 달라붙는다는 사실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질화갈륨 판에 유기금속과 산소 기체를 흘려보내고 온도를 올려주면 구불구불한 산화아연 벽이 생겨난다. 그런데 질화갈륨 층에 이산화규소 층을 씌우고 식각을 해서 어떤 패턴을 만든 뒤 기체를 흘리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 이산화규소 층을 원형으로 깎아내 그 밑의 질화갈륨을 노출시키면 산화아연 결정이 원형 기둥으로 자랄 것이다.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그렇게 된다. 그런데 나노구조를 자세히 보면 원기둥 속이 비어있다. 즉 나노기둥이 아니라 끝이 터진 나노튜브가 생긴다. 산화아연이 그냥 바닥에 있는 이산화규소에 붙는 것보다는 식각이 된 경계면, 즉 아래는 질화갈륨, 옆은 이산화규소가 있는 환경이 결정이 자라는데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일단 산화아연 결정이 만들어지면 기체는 산화아연 결정에 달라붙으며 위로 자라게 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나노튜브는 전압이 걸리면 끝에서 전자를 방출합니다. 브라운관의 전자총 같은 역할도 할 수 있죠.” 연구단은 최근 재료과학전문지 ‘어드밴스드 머트리얼스’ 온라인판에 실린 논문에서 이렇게 만든 나노튜브에서 나오는 전자가 형광물질을 자극해 강한 빛을 내는 현상을 보고했다. 깨알만한 면적에서 나온 빛이 실내조명이 있는 상태에서도 보일 정도다.
2002년 이후 이 교수팀에서 발표한 나노막대 관련 논문가운데 400회 이상 인용된 논문이 1편, 200회 이상이 2편, 100회 이상이 7편이나 된다. 불과 5~6년 만에 이 교수는 나노막대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다. 학부 때 물리학을 전공한 덕분일까. 관찰한 현상을 응용하는데 만족하지 않고 그 원리를 규명하는 데도 힘을 쏟은 결과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좀 더 나은 결과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앞으로도 다양한 나노구조물과 나노소자를 만들 계획입니다. 물론 관찰된 현상을 설명해주는 이론연구도 병행해야겠지요.” 이 단장은 논문에 실린, 나노벽이 만든 저널 이름 ‘Advanced Mate-rials’를 가리키며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대학에서는 연구보다 교육이 먼저
 ◀ 이규철 단장
◀ 이규철 단장
“저희 실험실에서는 원칙적으로 밤 9시 이후에는 실험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대학원생들이 밤새워 실험하는 모습을 대견스러워하는 교수들이 많은데 이 단장은 뜻밖의 말을 했다. 이렇게 학생들을 배려하는 것도 좋지만 연구가 늘어지지 않을까.
“그 반대입니다. 학생들이 밤늦게 실험실에 남아있는 생활이 습관화 되면 시간관리가 느슨해져 다음날 점심때가 지나서 실험실로 나오기도 합니다.” 이 단장은 대학원생들은 아직 연구자가 아니라 말 그대로 ‘학생’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실험실 생활도 교육의 연장이라는 것. 이때 습관을 잘 들여놔야 나중에 박사학위를 받고 나서 진짜 독립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맥락일까. 연구단에는 실험기기가 여럿 있는데 대부분 학생들이 직접 만들었다고 한다. 자기가 원하는 실험을 할 수 있는 장비를 직접 만들어봐야 그 원리도 이해할 수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응용할 수 있다는 것. 혹시 비용을 조금이라도 더 아끼기 위해서는 아닐까.
“후후, 비용을 생각한다면 기기업체에서 만든 완제품을 사는 게 낫겠죠. 학생들이 만들다보면 시행착오가 생겨 종종 돈이 더 들어가니까요.”
실험실 한쪽에는 스케일을 크게 한 증착장비를 만들고 있는 듯 커다란 금속제 부품이 여럿 보인다. “물론 학생들이 부품을 깎는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대신 부품을 설계해 제작을 의뢰하고 운영시스템을 만드는 일을 하죠.”
이 단장은 요즘 말하는 이공계 위기도 결국 대학원 생활부터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대학원생 스스로가 자신을 교수의 피고용인으로 생각하고 시키는 일만 하니 실험실 생활이 힘들고 창의적인 사고를 기르지 못한다. 교수들 역시 연구업적에 매달리다보니 학생 개인의 성장 보다는 결과를 빨리 내놓으라고 다그치기 일쑤다.
“창의성은 어느 날 갑자기 무(無)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창의적인 인재가 되려면 기초부터 차근차근 밟아나가야 합니다.” 이 단장의 ‘여유있는’ 실험실 방침은 사실 엄격한 자기관리를 요구하는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