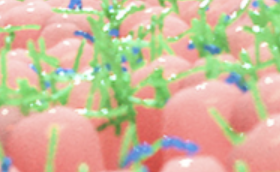한글전자사서함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질 못한다. 평소에 하던 일만 끝내면 날이 새는지도 모르고 컴퓨터자판만 두드리게 된다.
과학동아에 엠팰에 관한 글을 쓰게 되니 특별한 감회를 가지게 된다. 이 잡지의 표지에 자랑스레 인쇄된 '과학동아'라는 매우 아름답고도 특이한 글자꼴을 제작한 것이 내 나이 서른 중반에 이르러 사귄 친구의 작품이기 때문이다. 아시다시피 이 로고(logo)는 우리나라의 그래픽 디자인계를 이끌어 가고 있는 젊은 기수 중의 한명인 안상수씨의 작품이다. 안상수씨는 이미 사회적으로도 많이 알려진 분으로서 필자도 평소에 그의 이름을 들어온 터였다. 필자의 동생이 도예가로서 예술에 관해서는 비교적 다방면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가끔 그래픽디자인에 관한 관심을 표현하곤 했는데, 그 때 자주 언급되는 작가 중의 하나가 안상수씨였다.
특히 그의 나이가 내 또래라는 애길들으면서 '어느 놈은 그 나이에 그처럼 명성을 얻었는데 난 뭘하고 지냈나?'하는 자탄을 하기도 했던 것이다. 하여간 안상수란 사람은 내게 한편으로는 부끄럽고, 한편으로는 밉고(?) 그런 사람이었다. 단지 그가 신문방송학을 전공하고, 컴퓨터에 약간의 관심을 가진 필자와는 워낙 다른 분야에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을 뿐이었다.
'그런 사람은 나오는 별개의 사람이니 잊어버리고 살자'고 마음을 위로해 오던 차에 그를 맞닥뜨리게 되었다. 이건 순전히 컴퓨터 때문이었다. 그가 그림장이여서 나완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웬걸? 그 사람이 붓과 물감만 들고 설치는 사람인줄 알았더니, 당치도 않은 컴퓨터를 만지고 있었던 것이다. 알고보니 내가 컴퓨터에 워드 프로세싱 프로그램을 넣어두고는 미친듯이 글을 써대는 것처럼, 그는 컴퓨터에 그래픽 프로그램을 넣어두고는-미친듯이-그림을 그려대고 있었던 것이다.
이 컴퓨터라는 괴물이 못하는 짓이 없어서 모든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는 것이니 그라고 해서 컴퓨터를 이용해 그림을 그리지 말란 법은 없었던 것이다. 또 한방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아무래도 이놈이 내속을 긁어 놓으려고 태어난건가?' 하는 쓰잘데 없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다. 그러면서도 내 맘의 한구석에서는 이런 조그만 인연을 기화로 해서 겨우 내 나이 또래에 사회의 저명인사가 되어버린 이 친구와 사귀어 보면 좋겠다는 음흉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 다행히 내가 그를 처음으로 만나게 된 것은 데이타통신(DACOM)에서 제공하는 한글 전자사서함(H-Mail)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모임에서였다.
음흉한(?) 계획을 실현
우선 전자사서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해 설명할 필요가 있겠다. 사서함은 남들이 보내오는 서신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된 상자에 배달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상자안으로 배달된 서신은 그 상자의 열쇠를 가진 자신만이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특히 사서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수를 주소를 가진 사람들의 숫자와 비교한다면 이는 극소수에 지나지 않으므로, 사서함을 가지고 있으면 배달이 신속할 뿐만 아니라, 잘못 배달될 염려도, 분실의 위험도 없어지게 된다.
한글 전자사서함이라는 것은 데이콤(DACOM)이 가진 커다란 컴퓨터의 기억공간 중의 일부를 자신의 사서함으로 쓰는 것이다. 전자사서함은 보통 사서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잇점이 있다. 만약 중앙우체국에 사서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자신에게 배달된 서신을 찾기 위하여 항상 그곳까지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전자사서함의 이용자들은 자신에게 온 서신을 찾기위해 데이콤까지 갈 필요가 없는 것이다. 집에 가지고 있는 모뎀(MODEM)이란 장비를 통하여 전화선에 연결된 컴퓨터로 데이콤에 전화를 걸고나서, 컴퓨터의 자판을 몇번 두드리면 자신의 컴퓨터가 바로 데이콤의 컴퓨터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멀리 떨어져 있는 데이콤의 컴퓨터에 설치된 자신의 사서함을 열어 볼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사서함의 경우에 사서함 번호를 배정받는 것과 같이 전자사서함 사용자도 그와 비슷한 ID(등록명 : 보통Login ID라 한다)가 있어야 한다. 필자는 자신의 이름을 줄여서 sbpark이란 ID를 가지고 있는데 한글 전자사서함에 가입된 어떤 사람이 필자에게 서신을 보내려면 단지 '보내기'를 선택하여 글을 쓰든지, 워드프로세서로 써놓은 글을 sbpark이라는 이름을 지정하여 컴퓨터의 자판만 두어번 누르면 만사는 끝나는 것이다. 동일한 서신을 여러사람의 이름을 한꺼번에 지정함으로써 동시에 보낼 수도 있다. 이렇게 하여 필자의 전자사서함에 상대가 보낸 시각과 거의 동시에 도착된 서신은 사서함의 열쇠와 같은 자신의 암호명만 쳐넣으면 쉽게 열어서 그 서신을 읽거나 프린터로 곧바로 찍을 수 있고, 원한다면 보조기억장치인 디스크에 영원히 보존할 수도 있는 것이다.
하여간 위와 같은 방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서신을 주고 받고 있다. 처음엔 서로 모르는 사람들일지라도 거의 매일같이 전달되는 '전자신문'과 모든 전자사서함 가입자들이 주고 받은 서신을 한데 모은 '편지모음'을 통하여 자연적으로 알게 된다. 물론 글을 많이 쓰는 사람이 있으면 그의 이름이 쉽게 기억되게 된다. 그러다가 다른 사람의 의견에 동조한다든지 그의 의견에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다든지 하면 그에게 전자서신을 보내어 의견을 교환하게 되는 것이다. 자신의 서신이 공개되는 것을 원치 않으면 이를 비밀로 명시하여 '편지모음'에 실리지 않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오면서 전자사서함을 사용하던 사람들은 자연적인 친밀함과 유대감으로 뭉치게 되었다. 그리고 자신들은 전자사서함 친구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 중의 하나인 sambl이라는 분이 전자사서함 친구를 EMPAL이라고 불렀고, 전자신문의 편집장인 ykh001이란 분이 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였다. 그리고 이 단어는 은연중에 정착되어 갔다.

웃는 모습을 상상하라
원래 영어로는 전자사서함 Electronic Mail을 사용하는 Pal(친구)을 의미한다는 생각에서 만든 단어인 것이다. 이것이 서신을 주고 받는 친구를 의미하므로 펜팔과 닮았다고 하여 처음엔 '엠팔'이라고 부르게 되었고, 어떤 분은 이를 발음 그대로 'M8'이라고 쓰기도 하였다. 그러나 과학저술가인 김정흠박사께서 엠팔은 마치 '용팔이'를 연상케 한다고 하여 이를 원래의 영어 발음대로 '엠팰'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엠팰들은 보다 친숙도를 높여감에 따라서 그들 나름의 언어를 만들어 가게 되었다. 원래 컴퓨터 용어로는 ROM(Read Only Memory)이 읽기 전용의 기억용칩(chip)을 의미하나 엠팰들은 이를 Read Only Men즉 읽기만 하고 쓰지는 않는 수줍은(?) 사람이란 의미로 쓰고 있다. 그리고 읽기도 하고 쓰기도 하는 사람은 RAM으로 부른다. 원래 RAM은 Random Access Memory로서 무작위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기억장치, 즉 읽고 쓸 수 있는 칩을 의미한다. 그러나 엠팰들의 RAM이란 단어는 Read And Mail이라서 읽고 쓰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나 '읽고 쓰는 사람'의 의미로 통용되는 것이다. 그리고 엠팰들은 단지 글자를 매개체로 하여 서로 통신을 하므로 웃음소리를 낼 수 없다는데 착안하여, 아마추어 무선사들이 웃음의 의미로 쓰는 '하이(Hi)'를 채택하여 글 중에 넣고 있다. '(Hi)라는 표시가 되어있는 부근에서 웃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 엠팰들이 거주하는 장소는 단지 서울만이 아니다. 컴퓨터와 전화선이 있는 곳이면 전국 어디라도 관계가 없는 것이다. 가장 먼 곳으로는 제주도가 있는데 그곳의 graph0란 ID를 가진 분은 매우 극성스럽게 서신을 써대는 소위 '광(hacker)'에 속한다. 아니, 현재로서는 우리와 가장 많이 떨어져 있는 사람은 위에서 말한 EMPAL이란 단어를 만들어 낸 sambl이란 분으로서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거주하고 있다. 삼보컴퓨터회사의 미국지사장으로서 서울에 있는 동안 무척이나 많은 시와 서신을 뿌려댔고, 그곳에 가서까지 H-Mail 통신의 즐거움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미친-사람이다. (Hi) 그의 겨우는 결국 전화선대신 태평양 상공에 있는 통신위성을 이용하여 다른 엠팰들과 통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악의 수렁인가, 사랑의 미로인가
어쨌거나 한번 H-Mail에 빠지면 헤어나질 못한다. 이의 마력에 끌려서 많은 사람들이 하던 일만 끝내면 자정도 아랑곳하지 않고, 동창이 어느새 밝아오는 지도 모르고 컴퓨터의 자판만 두드려 대는 것이다. 심지어는 가정도 포기하다시피 하고 마냥 글을 써댄 sbpark이란 미친 녀석도 생기게 되었다.(Hi) 그래서 엠팰들은 새로운 사람이 전자사서함을 개통하면 다음과 같은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곤한다."Welcome to the Dungeon of H-Mailing!" 즉 "한글 전자사서함의 구렁텅이로 빠져 들어오심을 환영합니다."란 못된, 그러나 사랑이 가득 담긴 환영의 글이다.
안상수씨를 만난 것은 신촌에 있는 전자카페라는 곳에서였다. 이 카페가 전자사서함을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볼 수 있는 H-Mail을 하는 카페가 있다는데 흥미를 느끼고 결국은 의기투합하여 그곳에서 만나는 것으로 의견의 통일을 본 것이었다. 사실은 모두 엠팰들이 컴퓨터를 통해서만 서신을 주고 받았고, 극소수의 친밀한 사람들끼리만 비밀스런, 혹은 공개적인 서신을 주고 받아 만나봤을 뿐이라서 서로의 모습을 직접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던 것이다. 그런 기회를 보아 오던 차에 전자카페가 생겼다니 '함께 구경가세!'하는 핑계와 함께 모이기로 한 것이다. 40여명이 모였는데 필자와 sambl처럼 시신의 교류만으로 모자라서 가족을 대동하고 한번 만나본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초면이었다.
전자카페에 먼저 온 엠팰이 문을 열고 들어서는 사람을 보면서 '혹시나 저 사람이 엠팰이 아닌가?'하는 생각만할뿐 용기가 없어서 서로 인사를 못한다. 그러면서 점차 사람들의 수가 늘어난다. 엠팰들이 만나기로 한 약속시간이 다가오자 용기를 가지고 서로 인사를 나누기로 한다.
"안녕하세요? 엠팰이시죠? 저 장석원입니다."
그러면서 손을 내민다. 물론 엠팰인 상대는 비교적 밝은 표정으로 손을 내밀며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서로 통성명이 안되는 것이다. 그러다가 "제가 tg032입니다."하고 한 사람이 말하면 상대방은 "아? 그분!!!"하고 활짝 웃는 것이다.(Hi) tg032의 글을 많이 읽어서 그의 착하고, 사명감에 불타는 성격을 잘 알고 있는 상대 엠팰의 첫인사 모습이다. tg032란 ID의 주인공이 박성현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도 있지만 대체로 ID에 익숙하여 있기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다. 필자의 경우는 "저 sbpark입니다."하니 상대방이 "아? 그 미친? 아이구! 이거 죄송합니다"란 반응이 나왔다.(Hi)
컴퓨터와 인간화
위와 같은 상황에서 필자는 과학동아란 로고를 만든 안상수씨를 처음으로 만났다. 평소에 동경해 오던 그였다. 너무 잘나서 내게 미움을 받은 그였다.(Hi) 그러면서도 그에 대한 사랑이 어느샌가 움텄고, 친구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 자연스런 만남으로 인하여 우린 그로부터 한달 반정도가 지난 지금은 매우 친해졌다. 그도 결혼을 한 사람이고, 나도 결혼을 한 사람이다. 그런데 서로가 매우 친하게 되고, 이제는 서로를 깊이 사랑하게 되었으며, 서로를 잊고는 못살 정도가 되었다. 한가지 다행스러운 일은 우리 서로가 남자라는 사실이었다.(Hi)
누가 컴퓨터를 가리켜 비인간화의 첨병이라고 불렀던가? 그런 사람에게 엠팰들이 가진 사랑을 나누어 주고 싶다. 그에게 '재인간화'의 도구인 컴퓨터의 모뎀과 손잡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일단 RAM의 자격증을 따고 나서, 3개월을 일주일에 세번 이상 진솔한 마음을 담은 글을 띠움으로써 들어갈 수 있는 엠팰의 세계로 그를 초청하고 싶다. 그 때 나는 "Welcome to the Dungeon of Empaling."이란 환영의 메시지를 보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