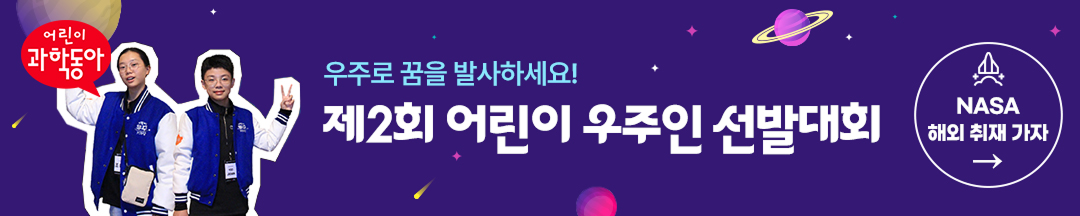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이 속담은 과학적으로 맞는 얘기일까요? 내가 만약 새였다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벌레를 잡으러 돌아다녔을 것 같아요. 새벽에 야외에 나가 보면 잠자리 같은 곤충들이 풀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몸에 이슬이 동글동글 맺혀 있는 걸 보면 밤새 그 자리에 있었나 봐요. 그렇게 앉아 있는 잠자리는 가까이 다가가도 잘 도망가지 않아요. 이처럼 잠자리는 새벽에 잘 움직이지도 않는데, 새는 어떻게 사냥을 할 수 있을까요?
 외온동물인 잠자리는 추운밤이 되면 나뭇가지에 가만히 앉아 있는다.
외온동물인 잠자리는 추운밤이 되면 나뭇가지에 가만히 앉아 있는다.

내온동물인 새는 주변 기온과 상관없이 활동할 수있다.
경제적이지만 제한된 엔진을 가진 외온동물
예전에는 조류와 포유류를 항온동물로, 그 외의 동물을 변온동물로 구분했어요. 하지만 이 구분에는 문제가 있어요. 조류 중에는 벌새처럼 밤과 낮의 체온이 다른 종도 있거든요. 그리고 심해에 살고 있는 어류나, 동굴 안에 사는 곤충은 1년 내내 체온의 변화가 거의 없지요. 그래서 내온동물과 외온동
물로 구분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답니다.
외온동물은 필요한 열을 주로 외부에서 얻어요. 그래서 대부분 낮은 온도에서는 활동할 수 없어요. 이에 비해 내온동물은 대사과정에서 발생한 열을 이용하기 때문에 주변 온도보다 높은 체온을 유지할 수 있어요. 새벽에 곤충들은 꼼짝 못하고 앉아 있지만 새들은 활동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곤충은
외온동물, 새는 내온동물이기 때문이에요.
페럿이나 햄스터처럼 작은 포유동물을 키우는 친구가 있나요? 이런 동물들은 매일 먹이를 주어야 하지요. 그런데 같은 크기의 뱀이나 도마뱀 같은 파충류를 키우는 친구들은 먹이를 자주 주지 않아도 될 거예요. 뱀은 심지어 한 달에 한 번만 먹이를 먹여도 충분하답니다. 뱀이나 도마뱀 같은 외온동물은 대사과정에서 나온 열을 이용해 몸을 데우지 않으므로 적게 먹고도 살아 갈 수 있어요. 자동차의 엔진으로 비유하면 적은 연료로 많은 거리를 주행할 수 있는 효율적인 엔진을 가지고 있는 셈이지요. 하지만 외온동물은 온도가 너무 낮거나 높으면 활동할 수 없어요.

곤충은 다리와 날개가 가슴에 연결되어 있고, 가슴은 이들을 움직일 수 있는 근육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근육을 움직이려면 근육에서 대사활동이 일어나야 해요. 그런데 온도가 너무 낮으면 대사활동이 일어나지 않고, 곤충도 움직일 수 없어요. 온도가 높아야 가슴에 있는 근육을 빠르게 수축하고 이완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외온동물의 대사활동은 보통 외부 온도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어요. 외온동물인 귀뚜라미는 날개를 이용해 노래를 만들어요. 따라서 귀뚜라미가 노래하는 속도도 외부온도에 따라 결정되지요. 그래서 귀뚜라미의 노래만 듣고도 외부 온도를 알 수 있어요. 이것을 ‘돌베어의 법칙’이라고 해요.

연료 소비 많지만 고출력 엔진 가진 내온동물세포에 들어 있는 미토콘드리아는 당과 지방을 이용해 생명체의 에너지원인 ATP를 만들어요. 그러나 당과 지방이 분해될 때 일부만 ATP로 변환되고 나머지는 열로 방출되지요. 내온동물의 세포는 외온동물의 세포보다 미토콘드리아가 몇 배나 많아요. 그래서 주변 온도가 바뀌어도 높은 활동성을 유지할 수 있지요. 전천후 고출력 엔진을 장착하고 있는 셈이에요.
사람의 체온은 약 37℃예요. 사람은 평생 36.5~37.5℃로 체온을 유지하지요. 지구 표면의 평균기온인 15℃와 비교해 엄청 높은 온도지요. 대부분의 내온동물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렇게 높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요. 내온동물은 내부 장기에서 대사가 일어나면서 열을 발산해요. 그 중에서도 간, 심장, 신장, 폐, 내장기관과 뇌는 몸무게의 약 7.7%만 차지하지만, 우리 몸에서 생산하는 열의 약 72.4%를 담당하고 있지요.
내온동물은 고출력의 엔진 덕분에 높은 활동성을 유지할 수 있지만, 단점도 있어요. 연료소비가 심하거든요. 높은 체온을 유지하려면 엔진에 연료를 자주 많이 공급해야 해요. 즉, 당과 지방을 끊임없이 제공해야 미토콘드리아가 열을 발산할 수 있답니다. 페럿이나 햄스터가 먹이를 자주 먹어야 하는 이유는 내온동물이기 때문이에요.

내온동물은 외온동물보다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사진)가 더 많다.그래서 내온동물은 훨씬 더 많은
열을 만들 수 있다.
내온동물은 먹이가 부족할 때 체온을 낮추기도 해요. 동면이나 휴면을 하는 경우이지요. 겨울 동안 동면을 하는데, 추위 때문이 아니에요. 바로 먹이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겨울에는 먹이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고출력의 엔진을 장착한 곰은 몸에 축적하고 있는 지방을 금방 다써 버리고 말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체온을 낮추고, 가지고 있는 지방을 최대한 절약해서 써야 하지요. 얼어죽지 않을 정도로만 대사활동을 유지하는 셈이에요.
벌새가 높은 체온을 유지한다면 하룻밤도 살아남기도 힘들 거예요. 1초에 수백 번씩 날갯짓하는 벌새는 가지고 있는 에너지원에 비해 연료소비가 아주 심하거든요. 그래서 높은 체온을 유지하게 되면 다음 날 동이 트기 전에 굶어 죽는답니다. 그래서 벌새는 밤 동안 체온을 낮추고 휴면에 들어가요.
“밥은 잘 먹었니?” “점심 먹고 치우고 나면 바로 저녁을 준비해야 해.”
가끔 엄마들이 하는 푸념이에요. 우리는 왜 이렇게 자주 먹어야 할까요? 바로 내온동물이기 때문이지요. 사람은 체온이 높아 남극을 제외한 거의 모든기후에서 살 수 있어요. 더운 여름에도, 추운 겨울에도, 온도가 급격하게 오르내리는 곳에서도 활동할 수 있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연료 소비가 가장 심
한 동물이에요. 다양한 환경조건에서 높은 활동성을 유지하는 내온동물이 치러야 하는 비용이지요.

벌새는 몸집이 무척 작지만, 1초에 수백 번씩날갯짓하느라 에너지 소비가 크다. 그래서 해가 진 뒤에 체온을 낮추고 휴면한다.

북극곰은 동면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북극의 겨울을 날 수 있다. 털과 몸속의 지방이 체내 열을 잘 보존하는 덕분이다. 오히려 여름에 높은 열을 방출시킬 수 없어 문제가 되기도 한다.


내온동물인 새는 주변 기온과 상관없이 활동할 수있다.
경제적이지만 제한된 엔진을 가진 외온동물
예전에는 조류와 포유류를 항온동물로, 그 외의 동물을 변온동물로 구분했어요. 하지만 이 구분에는 문제가 있어요. 조류 중에는 벌새처럼 밤과 낮의 체온이 다른 종도 있거든요. 그리고 심해에 살고 있는 어류나, 동굴 안에 사는 곤충은 1년 내내 체온의 변화가 거의 없지요. 그래서 내온동물과 외온동
물로 구분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답니다.
외온동물은 필요한 열을 주로 외부에서 얻어요. 그래서 대부분 낮은 온도에서는 활동할 수 없어요. 이에 비해 내온동물은 대사과정에서 발생한 열을 이용하기 때문에 주변 온도보다 높은 체온을 유지할 수 있어요. 새벽에 곤충들은 꼼짝 못하고 앉아 있지만 새들은 활동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곤충은
외온동물, 새는 내온동물이기 때문이에요.
페럿이나 햄스터처럼 작은 포유동물을 키우는 친구가 있나요? 이런 동물들은 매일 먹이를 주어야 하지요. 그런데 같은 크기의 뱀이나 도마뱀 같은 파충류를 키우는 친구들은 먹이를 자주 주지 않아도 될 거예요. 뱀은 심지어 한 달에 한 번만 먹이를 먹여도 충분하답니다. 뱀이나 도마뱀 같은 외온동물은 대사과정에서 나온 열을 이용해 몸을 데우지 않으므로 적게 먹고도 살아 갈 수 있어요. 자동차의 엔진으로 비유하면 적은 연료로 많은 거리를 주행할 수 있는 효율적인 엔진을 가지고 있는 셈이지요. 하지만 외온동물은 온도가 너무 낮거나 높으면 활동할 수 없어요.

곤충은 다리와 날개가 가슴에 연결되어 있고, 가슴은 이들을 움직일 수 있는 근육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근육을 움직이려면 근육에서 대사활동이 일어나야 해요. 그런데 온도가 너무 낮으면 대사활동이 일어나지 않고, 곤충도 움직일 수 없어요. 온도가 높아야 가슴에 있는 근육을 빠르게 수축하고 이완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외온동물의 대사활동은 보통 외부 온도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어요. 외온동물인 귀뚜라미는 날개를 이용해 노래를 만들어요. 따라서 귀뚜라미가 노래하는 속도도 외부온도에 따라 결정되지요. 그래서 귀뚜라미의 노래만 듣고도 외부 온도를 알 수 있어요. 이것을 ‘돌베어의 법칙’이라고 해요.

연료 소비 많지만 고출력 엔진 가진 내온동물세포에 들어 있는 미토콘드리아는 당과 지방을 이용해 생명체의 에너지원인 ATP를 만들어요. 그러나 당과 지방이 분해될 때 일부만 ATP로 변환되고 나머지는 열로 방출되지요. 내온동물의 세포는 외온동물의 세포보다 미토콘드리아가 몇 배나 많아요. 그래서 주변 온도가 바뀌어도 높은 활동성을 유지할 수 있지요. 전천후 고출력 엔진을 장착하고 있는 셈이에요.
사람의 체온은 약 37℃예요. 사람은 평생 36.5~37.5℃로 체온을 유지하지요. 지구 표면의 평균기온인 15℃와 비교해 엄청 높은 온도지요. 대부분의 내온동물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렇게 높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요. 내온동물은 내부 장기에서 대사가 일어나면서 열을 발산해요. 그 중에서도 간, 심장, 신장, 폐, 내장기관과 뇌는 몸무게의 약 7.7%만 차지하지만, 우리 몸에서 생산하는 열의 약 72.4%를 담당하고 있지요.
내온동물은 고출력의 엔진 덕분에 높은 활동성을 유지할 수 있지만, 단점도 있어요. 연료소비가 심하거든요. 높은 체온을 유지하려면 엔진에 연료를 자주 많이 공급해야 해요. 즉, 당과 지방을 끊임없이 제공해야 미토콘드리아가 열을 발산할 수 있답니다. 페럿이나 햄스터가 먹이를 자주 먹어야 하는 이유는 내온동물이기 때문이에요.

열을 만들 수 있다.
내온동물은 먹이가 부족할 때 체온을 낮추기도 해요. 동면이나 휴면을 하는 경우이지요. 겨울 동안 동면을 하는데, 추위 때문이 아니에요. 바로 먹이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겨울에는 먹이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고출력의 엔진을 장착한 곰은 몸에 축적하고 있는 지방을 금방 다써 버리고 말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체온을 낮추고, 가지고 있는 지방을 최대한 절약해서 써야 하지요. 얼어죽지 않을 정도로만 대사활동을 유지하는 셈이에요.
벌새가 높은 체온을 유지한다면 하룻밤도 살아남기도 힘들 거예요. 1초에 수백 번씩 날갯짓하는 벌새는 가지고 있는 에너지원에 비해 연료소비가 아주 심하거든요. 그래서 높은 체온을 유지하게 되면 다음 날 동이 트기 전에 굶어 죽는답니다. 그래서 벌새는 밤 동안 체온을 낮추고 휴면에 들어가요.
“밥은 잘 먹었니?” “점심 먹고 치우고 나면 바로 저녁을 준비해야 해.”
가끔 엄마들이 하는 푸념이에요. 우리는 왜 이렇게 자주 먹어야 할까요? 바로 내온동물이기 때문이지요. 사람은 체온이 높아 남극을 제외한 거의 모든기후에서 살 수 있어요. 더운 여름에도, 추운 겨울에도, 온도가 급격하게 오르내리는 곳에서도 활동할 수 있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연료 소비가 가장 심
한 동물이에요. 다양한 환경조건에서 높은 활동성을 유지하는 내온동물이 치러야 하는 비용이지요.

벌새는 몸집이 무척 작지만, 1초에 수백 번씩날갯짓하느라 에너지 소비가 크다. 그래서 해가 진 뒤에 체온을 낮추고 휴면한다.

북극곰은 동면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북극의 겨울을 날 수 있다. 털과 몸속의 지방이 체내 열을 잘 보존하는 덕분이다. 오히려 여름에 높은 열을 방출시킬 수 없어 문제가 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