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동차 시장에 시원한 에코(Eco)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환경(ecology)과 경제(economy)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소비자들이 늘면서‘친환경 경제운전법(Eco-driving)’을 구현할 신차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7월 국내 최초로 하이브리드차 양산모델이 등장했다. 현대차‘아반떼 LPi 하이브리드’와 기아차 ‘포르테 하이브리드 LPi’가 잇따라 출시된 것.
LPi엔진과 전기모터를 함께 쓰는 두 차는 바퀴가 회전할 때 만든 전기를 배터리에 저장해뒀다가, 가속할 때 모터를 구동시켜 엔진을 보조하기 때문에 연료 절감 효과가 있다. 실제로 같은 기종의 LPG차는 리터당 10km를 가지만 하이브리드차가 되면서 연비가 리터당 17.8km로 늘었다. 또 LPG는 연료의 특성상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해 친환경적이다.
LPi엔진 - 휘발유나 경유처럼 연료분사장치로 LPG를 엔진에 바로 분사시키는 방식. 기존에는 별도의 연료분사장치 없이 연료호스로 LPG를 공급했지만, 이로 인해 추운 겨울이면 LPG가 얼어 시동이 안 걸리고 연료의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에코드라이빙 모드가 있는 차량도 눈에 띈다. 기아차‘쏘렌토R’에 장착된 ‘액티브 에코 시스템’은 최적의 연비를 구현하기 위해 차량이 엔진, 변속기, 에어컨을 능동적으로 조절한다. 이 모드에서는 연료 낭비가 큰 급가속, 급제동을 막는다. 일반 모드에서 급히 가속페달을 밟으면 ‘부아아앙~’하고 금방 속도가 붙는데, 이 모드에서는 ‘부우우우앙~’하고 약간 미적거린 뒤에 속도가 붙는 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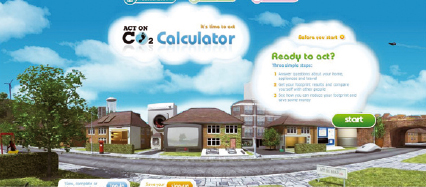
연료 절약은 기본, 교통사고도 줄여
하이브리드차 또는 에코드라이빙 기능을 탑재한 차는 기존 자동차보다 환경과 경제성을 중시한다. 예를 들어 하이브리드차는 주행 중 신호 대기나 정체로 인해 잠시 멈출 때면 시동이 자동으로 꺼진다. 공회전으로 인한 연료낭비를 막기 위해서다. 출발할 때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면 다시 시동이 걸리긴 하지만 주행 중에 시동이 꺼진다는 사실은 기존의 운전개념으로 생소한 일이다.
또 에코드라이빙 모드의 차는 주행할 수 있는 최대 속도에 제한을 둔다. 따라서 고속으로 드라이브를 즐길 수 없고, 원하는 만큼 에어컨의 온도를 내릴 수 없다. 예전만큼 편하고 안락한 기능을 자동차에게 기대하긴 어려워진 셈이다.
이런 흐름은 분명히 그동안 자동차가 발전해온 과정에 역행한다. 대림대 자동차공학과 김필수 교수는 그 이유를 내연기관의 한계에서 찾는다. 그는 “더 이상 내연기관의 효율을 향상시킬 수 없고, 수소연료전지 같은 차세대 동력원으로 바꾸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현재의 자동차산업은 다소 편이성이 떨어지더라도 경제적인 효율을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는 기술에 집중돼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도 이런 흐름을 부추겼다. 현재는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가 내뿜는 이산화탄소를 특별히 감소시키는 기술은 없다. 대신 연비를 높여 연료를 적게 쓰는 것이 간접적인 대책이다.
김 교수는 “현재로서는 에코드라이빙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에코드라이빙의 실현 과정을 3단계로 구분했다. 간단히 구분하자면 첫 번째는 사람의 의지만으로 실천하는 단계, 두 번째는 연료 절감을 위해 기술의 도움을 받는 단계, 세 번째는 도로와 교통시스템을 개선해 지능형 교통인프라를 구축하는 단계다.
1단계는 운전자 스스로 에너지 부족을 자각하고 운전습관을 개선해 연료 소비를 줄이는 방식이다. 전문가들은 “급출발하지 않기, 시속 10km 줄이기, 공회전은 2~3분 이내로 하기 등 약 10개의 행동지침만 잘 실천해도 20~30%의 연료절감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에코드라이빙 실천운동은 2003년 영국에서 가장 먼저 일어났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전기록과 연비를 등록하면 운전태도를 점검해주고 개선점을 보여주는 맞춤형 서비스를 하는 한편, 에코드라이빙 수업을 운전면허 교육과정에 추가하라는 법도 제정했다. 에코드라이빙 운동은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8개국으로 확대됐다. 프랑스는 2007년 12월부터 배기가스 할증제를 도입했다.
일본은 2004년부터 에코드라이빙을 시행한 결과 교통사고 건수가 50% 감소하는 부가적인 효과를 얻었다. 미국은 지난해 후반부터 캘리포니아 주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에코드라이빙 운동을 시작했다. 김 교수는 “일본, 유럽, 미국 등 세계 3대 축이 모두 동참하면서 에코드라이빙 운동은 이제 세계적인 운동으로 승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계기판에‘꽃’을 피우려면
온실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거나 양을 줄인 친환경 자동차로는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연료전지차, 태양광자동차, 천연가스차, 클린디젤차가 있지만 현재 하이브리드차만 상용화되고 있다. 지금의 하이브리드차가 가솔린엔진, LPi엔진 같은 내연기관과 전기모터를 사용해 얻는 에너지 효율은 9% 정도.
이에 반해 전기차는 발전소의 에너지 효율인 20~30%를 그대로 이용하기 때문에 효율적이다. 기아자동차 국내마케팅실 서춘관 이사는 “하이브리드차를 더 개선하고 발전시키면 3~4년 안에는 전기모터로만 주행하는 전기차를 상용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에코드라이빙 가이드 기술도 발전하고 있다. 운전자는 자신의 운전 상태가 어떤지 알면 가능한 한 경제운전을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경향이 있다. 자동차연료절감장치 전문업체인 모소모토에서 개발한 연비표시기 iEDS는 운전 상태에 따라 정속주행이라면 파란색, 가속주행이라면 빨간색, 친환경 경제운전 상태면 녹색을 표시한다. 운전자는 실시간으로 계기판에 있는 색깔을 확인하면서 자신의 운전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경제운전 정도를 채점하는 방식도 있다. 기아차 ‘포르테 하이브리드 LPi’ 계기판에는 잎 모양의 표시창이 있는데, 경제운전으로 연료가 절약되는 만큼 불이 켜지는 잎의 개수가 늘어난다. 좋은 운전 상태가 계속되면 계기판에 꽃이 핀다. 하이브리드차나 에코드라이빙 가이드 기술은 에코드라이빙 실현과정 중 2단계에 속한다.
신호대기 줄이는 지능형 교통시스템
신호대기시간만 줄여도 공회전으로 인한 연료 낭비는 크게 줄어든다. 내리막길에서 자동차의 관성력을 이용하면 연료를 쓰지 않아도 주행할 수 있다. 교통량에 따라 신호체계가 바뀌고, 관성주행이 가능한 구간을 미리 알려주는 시스템이 마련되면 에코드라이빙의 효과는 크게 높아진다. 지능형 교통시스템의 도입. 이것이 에코드라이빙 실현의 3번째 단계다.
아주자동차대 자동차학부 고광호 교수는 연료차단상태에서의 관성주행을 연구했다. 그는 “엔진회전수가 1500rpm 이상이고, 주행속도가 시속 50km를 넘을 경우 가속페달에서 발을 떼면 연료공급이 완전히 차단된다”며 “이를 이용하면 관성력만으로 자동차를 주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내리막길이 보이면, 미리 가속페달을 밟아 속도를 올린 뒤에 내리막길에서는 페달에서 발을 떼고 갈 때 가장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해외에서는 지능형 교통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자동차회사들이 적극 나서고 있다. BMW는 독일 뮌헨시와 함께 교통량 정보에 따라 신호체계가 바뀌는 시스템, ‘어라이브(Arrive)’를 개발했다. 신호체계가 개선된 결과, 평균 5개의 신호를 기다리던 도로에서 평균 2개 정도의 신호만 기다려도 돼 신호대기시간이 줄었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50%나 감소했다.
국내에서도 지능형 교통체계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은 있지만 아직 유럽과 같은 수준을 기대하긴 어렵다. 현재는 도로에 설치된 CCTV, 교통량·속도 인식장치(VDS) 등의 장비를 통해 교통정보를 수집한 뒤 휴대전화 이용자에게 제공해주는 정도다. 앞으로 지능형 교통체계가 정착되면 운전자에게 ‘얼마의 속력으로 달리면 어느 구간까지 신호에 걸리지 않고 주행할 수 있다’는 수준의 정보까지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