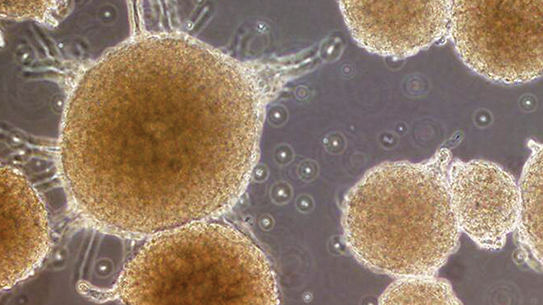육상에서 가장 빠른 동물인 치타는 1초에 무려 30m의 속도로 달린다. 세계 최고의 스프린터보다 3배나 빠른 속도다. 그러나 실망할 필요는 없다. 적어도 장거리에서는 인간이 최고 수준으로 말도 따라오지 못한다.
이런 인간의 놀라운 장거리 주행능력은 인체의 독특한 구조 때문이라는 연구결과가 ‘네이처’ 11월 18일자에 실렸다. 미국 유타대 생역학 전문가인 데니스 브램블 교수와 하버드대 다니엘 리버만 교수는 인간과 동물을 대상으로 발로 돌리는 바퀴를 밀게 하고 이때 다양한 근육과 인대의 활동을 측정했다.
그 결과 인체에서 장시간의 운동에 적합한 특징을 추출할 수 있었다는 것. 예를 들어 영장류 가운데 인간에게만 존재하는 목덜미인대는 두개골 아래 부분과 목을 연결하고 있는데, 달릴 때 머리가 앞뒤로 흔들리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한다.
한편 긴 아킬레스건을 비롯해 다리의 힘줄 배치를 보면 스프링 역할을 해 매번 발을 뻗을 때마다 에너지의 절반을 비축해 다음 번에 방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인간의 통통한 엉덩이 모양을 만들어주는 큰볼기근은 걸을 때는 가만히 있지만 달릴 때는 수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장거리 주행 능력은 현생 인류가 속하는 호모(Homo) 속(屬)이 등장한 약 200만년 전에 갖춰진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이전의 오스트랄로피테쿠스와 구분되는 면”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장거리 주자가 됐을까. 리버만 교수는 “우리 조상은 청소동물로 맹수가 먹다 남긴 고기를 먹기 위해 하이에나와 경쟁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평선 멀리 독수리 무리가 보이면 그리로 달려가 찌꺼기를 챙겼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기사의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기사 전문을 보시려면500(500원)이 필요합니다.
2004년 12월 과학동아 정보
🎓️ 진로 추천
- 생명과학·생명공학
- 문화인류학
- 체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