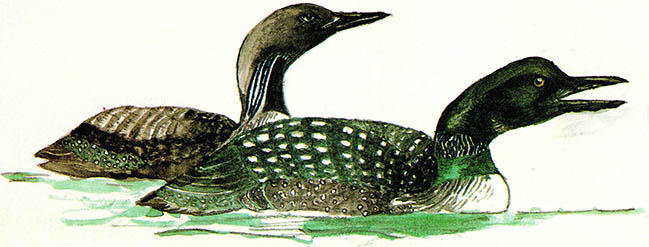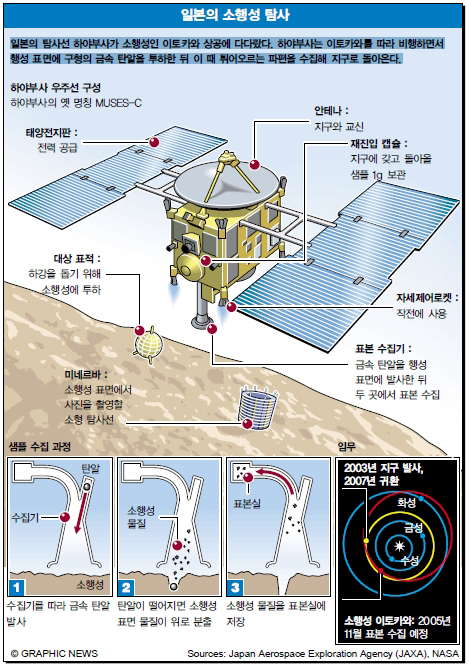시조새의 가슴뼈에는 날개를 움직이는 근육, 즉 용골돌기가 붙어 있다. 더불어 새와 같은 것은 깃털이 있다는 점이다.
새들이 척추동물 가운데서 매우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은 그들의 탁월한 비행 능력 때문이다. 이러한 뛰어난 능력은 오랜 세월동안 지속적인 발전의 결과다. 높이 재빠르게 나는 새에 대한 자세한 발전상은 땅에서 서식하는 지표 동물과는 달리 학술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 새들에게는 화석의 발견처럼 뚜렷한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파충류의 비늘과 새의 깃털은 단백질 성분
새는 고생대의 파충류에서 진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작은 공룡 가운데 하나인 테로포드(Theropod)와 같은 것은 일어선 채 뒷다리로 걸었으며 새와 흡사한 골격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보행습관 때문에 앞다리는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돼 더욱 발달할 수 있었다.
또 다른 공룡의 정교한 뼈의 구조에서 볼 수 있듯이 공룡가운데 몇몇은 냉혈동물이 아니라 온혈동물이었음이 밝혀졌다. 따라서 그들은 태양열에 의존하고 있던 냉혈동물의 동족과는 달리 더욱 활동적이었으며 지속적인 높은 체온은 그들에게 격리된 생활을 가능하게 했다. 파충류의 비늘은 돌출부와 바깥 절연층에서 새의 깃털로 형성됐으며 파충류의 비늘과 새의 깃털은 모두 단백질인 케라틴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파충류와 새들의 밀접한 관계는 독일 바이에른 지방 졸른호펜의 폴라텐칼켄에 소장돼 있는시조새 화석에 의해 입증됐다. 시조새가 오늘날의 새의 직접적인 조상인지, 아니면 파충류에서 새가 되기까지의 발달과정에서 다른 역할을 했는지 그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그것은 특별한 가치가 있는 화석으로 남아 있으면서 명확한 파충류로서 또는 새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시조새 화석은 첫눈에 마치 테로포드 공룡처럼 보인다. 만일 화석에 남아 있는 새의 깃털모양이 정확하고 분명치 않았더라면 무심히 새와 비슷한 파충류로 여기고 그냥 박물관에 소장했을 것이다.
시조새의 크기는 까치만하다. 파충류의 명확한 특징으로는 턱에 이빨을 가지고 있고 쭉 뻗은 몸에는 긴 고리가 달려 있다는 점이다. 시조새의 가슴뼈에는 날개를 움직이는 근육, 즉 용골돌기(龍骨突起)가 붙어 있다. 더불어 새와 같은 것은 깃털이 있다는 점이다. 몸 앞쪽에는 놀랍게도 오늘날의 새의 모양과 동일한 날개가 달려 있다.
이 새의 앞발은 명확하게 따로 떨어진 세 개의 발가락이 달려 있었으며 발톱은 구부러져 있다. 그러나 그 시조새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다만 추측만 할 뿐이다.
시조새는 다른 새들처럼 현착지(懸着肢 : 수직으로 된 벽에 앉을 수 있음)와 앞으로 뻗은 세 발가락, 한개의 뒷발가락을 가지고 있으며 발가락들은 모두 구부러진 발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시조새가 나무에서 이리저리 기어올라 다닌 것은 가능한 일이다.
시조새의 비상능력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견해가 있다. 시조새에게 강한 비행 근육이 결여된 것을 보면 지속적인 비행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바람을 가르는 날개(칼깃)의 불균형은 다시 말해 그들이 한번의 강력한 충격비행에 한했음을 말해 준다. 이러한 날개의 발달은 시조새의 선조 때부터 시작됐으며 앞다리의 뒷쪽에 나있는 비늘이 매끄러운 면쪽으로 길어진 것이다.

시조새는 현존하는 새들과 같은 혈족
이 시조새보다 일찍이 살았던 새들은 아주 매끄럽게 나무에서 나무로 날 수 있었다. 비상력이 점점 커지고 분화되면서 좀더 비상력이 뛰어난 날개가 됐다.
이것으로 능동적인 비행이 가능해졌으며 동시에 크고 강한 근육이 형성됐다. 물론 이 점은 확실히 증명된 공론이 아니다. 다만 시조새가 땅에서 걸어다닌 동물이라는 견해 때문에 기준점이 있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깃털과 날개의 발달에 차이가 난다. 시조새는 분명히 깃털로 싸여 있고 날개가 있으며 날 수 있는 능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시조새는 오늘날 인류와 함께 공존하는 새들과 같은 혈족임에 틀림없다.
시조새는 쥐라산맥에서 살았으며 약 1억4천만년 전에는 오늘의 독일의 숲에서 살았다. 새는 치열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시조새는 특별히 구분해서 곤충을 잡아먹지는 않은 듯하다. 앞으로 계속적인 발굴이그들의 생활방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시조새와 화석에서 발견돼 알려진 백악기의 가장 오래된 새들 사이에는 3천 만년이라는 긴 공백이 있다. 에날리오르니스(Enalionis)라 불리는 새가 있는데, 이는 아비(물새의 일종)와 유사한 모양의 새로서 앞쪽 관절이 아주 퇴화돼 있었고 구조는 나는 새와 같다.
이 백악기에서 다시 3천만년 후에는 이미 화석이 많이 발견됐다. 화석으로 밝혀진 것은 헤스페뢰니스(Hesperoenis)로서 역시 날수 있는 아비의 일종이었다. 그리고 이히티요르니스(Ichthyornis)는 중간 크기의 새인데, 흉골에 강한 깃을 가진 것을 보면 활공력이 뛰어난 새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백악기 말에 가서야 처음으로 오늘날과 같은 형질의 새가 나타났다. 시신세(신생대 제3기의둘째시대), 즉 5천4백만년 전에 살던 새들이 오늘날과 같은 새의 유형임이 증명됐고 시신세 후기 지층에서 왜가리속들과 독수리들의 잔해가 발견됐다. 전기 지층에는 오리와 뜸부기들 그리고 플라밍고의 뼈들이 출토됐다.
시신세 말기, 즉 약 4천만년 전부터 지금까지는 적어도 30여 종의 근대새들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새 중 몇 종류는 대개 참새과에 속한다. 시신세가 끝날 무렵 지구에는 오늘날과 같은 종류의 새들로 가득했다.